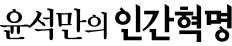![세계 최대 갑부 중 한 명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3/689f4219-29b2-43c8-841c-e00209325474.jpg)
세계 최대 갑부 중 한 명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중앙포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별칭입니다.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제프 베조스(아마존) 등과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그이지만 실제 삶은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고향인 오마하에서, 지금 같은 갑부가 되기 이전인 1958년에 3만 달러를 주고 산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60년째 살고 있죠.
워런 버핏, 60년째 평범한 단독주택 생활
"30조원 기부, 그만큼 더 기부 예정"
르네상스 혁명 이끈 메디치 가문
농민 출신에서 교황· 왕비 배출 명문가 성장
다빈치·미켈란젤로·갈릴레오 키워
문명 발전 중심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물질 성장 걸맞은 정신적 성숙 이뤄야
그는 지난해 미국 PBS 방송 인터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10만 달러를 벌면 100만 달러를, 100만 달러를 벌면 1000만 달러를 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버핏은 “돈 버는 과정을 즐기고, 의미 있게 돈을 쓰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벌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버핏은 돈을 ‘잘 쓰기’로 유명합니다. ‘잘 쓴다’는 것은 가치 있게 쓰는 걸 뜻합니다. 지난 한 해 버핏이 세계에 기부한 금액은 31억7000만 달러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버핏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275억 달러(약 30조원)를 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만큼의 재산을 더 사회에 내놓을 계획이고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왼쪽)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오른쪽).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3/1144dca3-e3bd-4412-80c2-ae64add2d7e3.jpg)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왼쪽)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오른쪽). [중앙포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생색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기부금 대부분을 교육·문화·예술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맡깁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나보다 게이츠가 더 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게이츠는 버핏의 뜻에 따라 주로 청소년 교육과 인재 양성 등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게이츠 역시 버핏 못지않은 돈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버핏과 게이츠 외에도 미국의 갑부들은 사회공헌에 적극적입니다. 2년 전 딸 맥스의 탄생을 기념해 전 재산(630억 달러)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대표적이죠. 지난해 이들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갑부로 올라선 제프 베조스 역시 사회 환원에 큰 의지를 보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휴양지 선밸리에서 열린 선밸리콘퍼런스에 참가한 버핏(오른쪽)과 게이츠(왼쪽).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3/6958f698-ead0-49d6-8b92-08a95a76aab3.jpg)
미국 아이다호주 휴양지 선밸리에서 열린 선밸리콘퍼런스에 참가한 버핏(오른쪽)과 게이츠(왼쪽). [중앙포토]
역사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르네상스기의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는 금융업을 통해 유럽의 돈을 끌어모으다시피 해서 한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문인·예술가를 후원하는 데 쓰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죠.
![작가 시오노 나나미.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3/c37f4c16-211c-47b6-9135-443922589536.jpg)
작가 시오노 나나미. [중앙포토]
지난주 ‘인간혁명’은 『신곡』(단테)의 내용과 이 작품이 쓰인 배경을 통해 중세가 몰락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직자와 귀족 등 지배층의 타락이 공고했던 사회질서에서 균열을 가져왔고, 새롭게 지배세력으로 상인계층이 등장하면서 중세가 무너졌다는 거였죠. 2500년 전 철기혁명에 준하는 상업혁명을 통해 상인들이 물질적 부를 이루면서 피렌체 같은 도시국가가 발전했습니다. 상인들은 귀족들이 갖고 있던 노빌레(nubile·품격)를 갖추기 위해 학문과 예술을 중시하며 지식혁명을 이끌었죠. 이때 지식혁명의 중추가 메디치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한 피렌체는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중 가장 부유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돈이 모이는 곳이었죠. 조반니가 죽고 그의 아들 코시모 메디치(1389~1464)가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메디치 은행은 유럽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혹자는 당시 유럽의 부 중 절반이 메디치 은행에 속해 있었다고도 하죠.
![메디치 가문의 번영을 이끌었던 코시모 메디치.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3/5fc00092-f788-4fc0-a682-6755e0f96dea.jpg)
메디치 가문의 번영을 이끌었던 코시모 메디치. [중앙포토]
!['군주론'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3/fbec6afb-bf1d-45fa-b267-46316f64a9b9.jpg)
'군주론'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 [중앙포토]
둘째는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입니다. 메디치家는 문화·예술·학문을 사랑하는 메세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재능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와 과학자·지식인 등이 메디치家 후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러했듯 혈통이 아니라 능력만으로 출세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만들며 르네상스를 이끌었죠.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그리스 인문의 부흥을 꿈꾼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작. 실존 인물들을 화폭에 담았다.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3/32e5a7d7-a566-4cd6-99d1-29a26337b50a.jpg)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그리스 인문의 부흥을 꿈꾼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작. 실존 인물들을 화폭에 담았다. [중앙포토]
지난주 ‘인간혁명’에서 제기한 질문, ‘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금융업의 발달로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상업혁명이 일어나 물질적 성장이 크게 이뤄졌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지배세력이 성직자와 귀족에서 상인들로 교체되며 능력 중심의 사회 풍토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메디치家와 같은 지배층의 사회공헌으로 인문정신이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때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르네상스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는 지식혁명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죠.

그러나 기술혁명이 곧바로 문명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르네상스와 같은 인문의 꽃을 피우기 위해선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첫째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는 이 같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진 사회지도층이 더욱 많아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이 두 가지 모두 부족해 보입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슈 중엔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부패와 비리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또 한 편에선 ‘노오력’ 해도 성공할 수 없고 ‘열정페이’로 제때 보상조차 못 받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것으로 덤덤하게 여겨지고 있죠.
!['스페이스 셔틀(space shuttle·우주왕복선)'.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3/b777a4a3-4037-404e-8437-1542ab56e0a4.jpg)
'스페이스 셔틀(space shuttle·우주왕복선)'. [중앙포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 그것은 언제나 인류의 가장 큰 도전과제였고 문명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꿈의 시작점은 메디치와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입니다. 버핏과 게이츠, 저커버그 같은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종 때 편찬된 '고려사'.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3/ac502be1-047f-4366-b64e-171b390b8a8b.jpg)
문종 때 편찬된 '고려사'. [중앙포토]
여기서 ‘간악한 도둑’은 고려말 권문세족을 뜻합니다. 권력과 부를 독차지한 권문세족은 과거(科擧)가 아닌 음서(蔭敍)를 통해 벼슬을 대물림했죠. 땅이 얼마나 넓었으면 산과 강을 경계로 삼을 정도였을까요. ‘송곳 하나 꽂을 땅(立錐之地·입추지지)’이 없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때입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 나라는 둘로 쪼개져 있고, 신분의 대물림으로 계층 이동 가능성도 막혀 있던 사회. 멸망하기 직전 고려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또한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민(民)’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배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던 정도전과 정몽주처럼 우리 사회에도 새로운 사회지도층이 나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보면 어떨까, 꿈을 꿔 봅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윤석만의 인간혁명‘은 매주 토요일 아침 업데이트 됩니다.
#홈페이지(http://news.joins.com/issueseries/1014)

윤석만 기자는